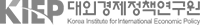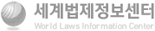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러시아의 대글로벌사우스 원자력외교 동향과 시사점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3/1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들어 러시아는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 체결, 이란과 신규 원전 건설 협상 진행, 미얀마와 소형 원전 건설 협정 체결 등 대글로벌사우스 원자력 협력을 이어가며 전쟁과 제재 국면에서도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의 우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 강화1)
※ 2023년 말 기준 러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은 7개국(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튀르키예, 헝가리, 벨라루스) 내 22기 원전 건설을 추진 중. (참고)전쟁 발발 직후 2022년 5월 핀란드는 러시아와 계약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파기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 탈피(원전 연료 구매 중단 등)2)
- 2025년 1월 13일 러시아는 베트남과 2016년 중단된 닌투언(Ninh Thuan)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3)
ㅇ 러시아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에 원자력 기술센터 설립 지원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촉진해 왔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로스아톰은 원전 건설,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주요 부품 현지화 등 협력 비전을 제시
- 2025년 1월 17일 러시아는 이란과 정상회담에서 신규 원전 가능성을 논의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원전 부지 모색 및 소형 원전 협력 가능성 논의 중4)
- 2025년 3월 4일 러시아는 미얀마와 정상회담 계기 소형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
ㅇ 러시아는 2022년 9월 제7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미얀마와 원자력 에너지 도입 협정 체결
- 이 외에도 최근 러시아는 우간다와 원전 건설 가능성 논의(1.24일), 나이지리아와 원자력 협력 논의(2.19일), 브라질과 우라늄 농축 및 전환 서비스 계약 체결(2.28일) 등 추진
ㅇ 러시아는 2024년 10월 우간다와 원자력 및 원전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우간다는 최초 원전을 2031년 운영 개시 목표로 추진 중
ㅇ 러시아는 2017년 나이지리아와 원전 및 원자력 연구센터 건설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07년에 원전 도입 로드맵을 채택하며 신규 원전 건설에 관심
☐ 러시아는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대응 차원에서 전력수요 급증이 전망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수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전 시장 지배력을 유지․강화
-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러시아는 원자력 기술 및 우라늄 생산·농축 분야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소형 원전을 앞세워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공략
ㅇ 2017년 이후 건설이 시작된 52기 원자로 중 23기가 러시아 설계(25기는 중국 설계)이며,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 시장의 40%를 차지5)
* 세계원자력협회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AI 등 신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로 2030년까지 세계 우라늄 수요가 약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6)
ㅇ 러시아는 2024년 5월 중앙아시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과 소형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로스아톰 최초의 소형 원전 건설 수출 성과
* 또한 러시아는 현재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 후보국(러, 한국, 중국, 프랑스) 중 하나7)
ㅇ 러시아는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에 해상 부유식 소형 원전 수출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24년 9월 몽골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소형 원전 건설을 논의
- 21세기 중반까지 글로벌 전력수요가 약 1.8~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전력수요 증가(약 80% 차지)를 견인함에 따라 역내 원전 수요도 확대 전망8)
ㅇ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413기(총 설비용량 372GW) 가운데 글로벌사우스(8개국)에 91기의 원자로(22%, 총 설비용량 73GW)가 가동 중
ㅇ 현재 글로벌사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건설 중인 원자로 수의 70% 이상이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해당하며, 원전을 보유한 글로벌사우스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자력 지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 (보유)파키스탄, 남아공, (보유 및 건설 중)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신규 건설 중)방글라데시, 이집트, 튀르키예. 러시아는 새롭게 원전 가동 국가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방글라데시, 이집트, 튀르키예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
*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 증가 전망)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2.4~3.2배), △아프리카(2.5~3.7배), △중동(4.4~7.7배)
-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3배 확대한다는 선언문 채택9)
ㅇ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뿐 아니라 수소나 합성연료 생산 등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 원자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로 합의
☐ 과거 원자력 발전이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글로벌사우스로 대변되는 신흥경제권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
- 원전 건설은 약 10년이 걸리고, 새로운 원자로의 수명은 60년에 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원자력 협력을 통해 맺은 관계가 파이프라인을 통한 장기 가스 공급 계약보다 실효적이라고 평가
- 러시아는 2024년 10월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브릭스 원자력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며 향후 회원국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며, 공급자 관점에서 브릭스 원자력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 공고화 목표
* 브릭스 회원국 9개국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이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집트는 원전 건설 중
- 러시아가 확대되는 글로벌사우스 원자력 시장에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원전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주요 고려사항
---
*각주
1) Российский атомный экспорт(https://www.atomic-energy.ru/russian-nuclear-export).
2) 2023년 말 기준 자국 내에 가동 중인 원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93기), 프랑스(56기), 중국(55기), 러시아(37기), 한국(26기) 순이며, 가장 많은 규모의 원전을 건설 중인 국가는 중국(23기), 인도(8개) 순.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력 수요 증가”(2023. 4. 14.), KIEP EMERiCs.
3)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가 8년간 중단된 VVER-1200 2기(총 4,000MW)를 중부 남중국해 연안 닌투언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 재개를 승인. 1‧2호기를 각각 러시아와 일본이 수주하기로 했으나, 2016년 베트남이 경제적 부담과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 에너지경제연구원(2025.2.7.),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p. 34.
4)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이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Bushehr) 원전(2013년 가동 시작) 건설에 참여. 강부균(2025. 1. 23), “러시아-이란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지역연구 동향세미나(제1호).
5) “A new era for nuclear energy beckons as projects, policies and investments increase”(2025. 1. 16.), IEA.
6) 2023년 기준 미국에 공급된 농축 우라늄의 27%가 러시아산으로, 미국은 2024년 5월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우라늄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모색. 미국과 함께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우라늄 공급망 강화 노력 경주 중
7) 카자흐스탄은 2025년 7월 1일까지 핵심 기술 공급사 선정 계획
8) 중국이 전력수요 증가의 4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인도는 15~18%).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и глобальный Юг
23 января 2025”(2025. 1. 23),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СМД).
9) (참여국) 한국,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지지 6개국 늘어”(2024. 11. 18.),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2023.12.18.),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p. 1.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협상 난항...헌법 수정 및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현안과 과제 | 2025-03-07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의 정국 혼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 2025-03-11 |




 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ㆍ유라시아